 프로필 보기
문통최고
프로필 보기
문통최고
개인적으로 젊은 남성 집단을 가장 잘 분석했다고 생각하는 글
| 링크주소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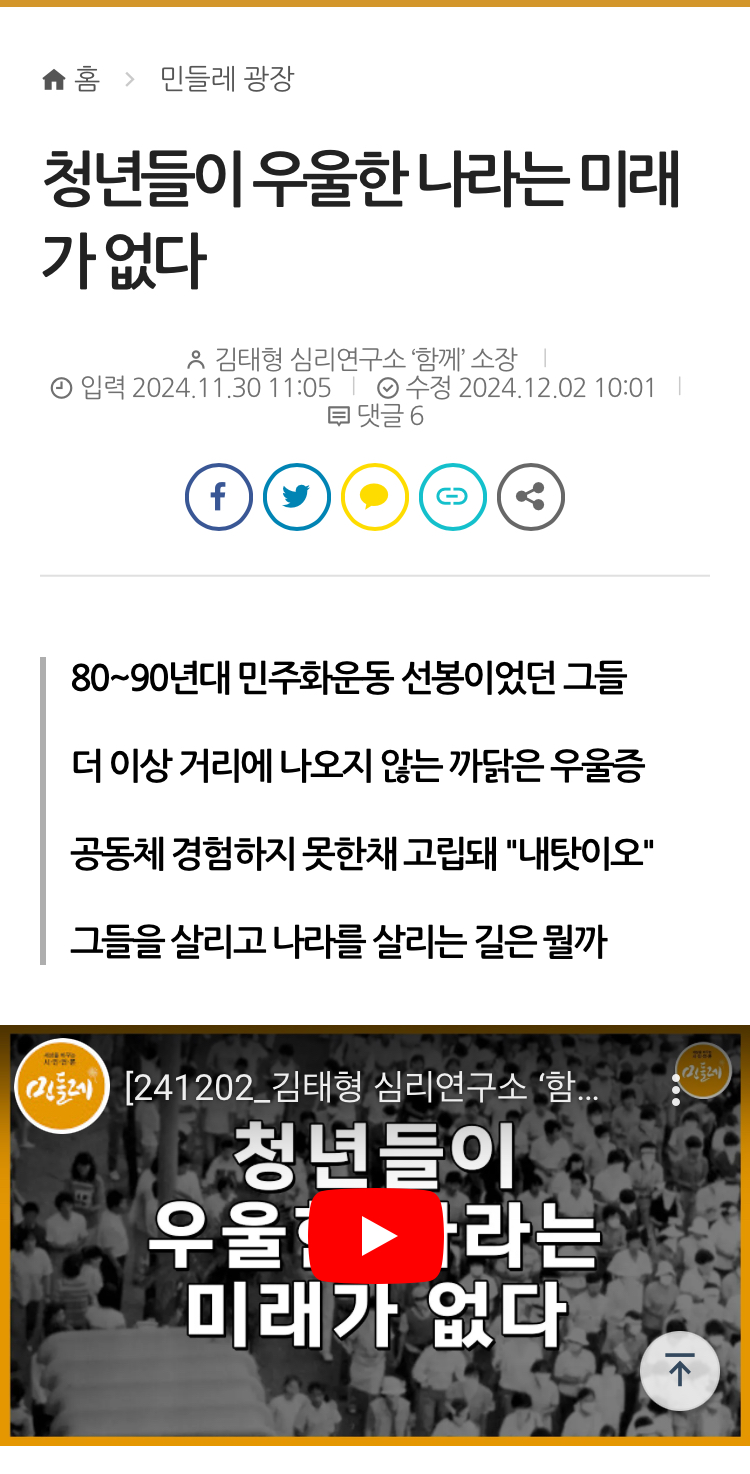
공동체를 경험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첫 개인주의 세대
반면에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어려서는 놀이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고, 청소년기부터는 개인 간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교공동체도 경험하지 못했다. 청년기 이후부터는 더더욱 공동체 경험이 없다. 결론적으로 청년세대는 어려서부터 계속 개인 단위로 성장했고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치열한 개인 간 승자독식 경쟁, 개인 간 서열경쟁이 벌어지는 무서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장년들과는 달리 모든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이 아닌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동시에 공동체가 중요하다거나 좋은 것이라는 말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청년세대야말로 최초로 한국 사회에 등장한 진정한 개인주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으로 고립되어 홀로 세상에 맞서면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서열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공동체는커녕 친구조차 사귀기 힘들다. 중장년 세대는 중고등학교 시절 나아가 대학 시절에도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 반면에 오늘날의 청년들은 초등학교 시기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평생을 친구 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까지도 개인 간 경쟁으로 인해 공동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친구가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친구가 없다면 우울해지더라도 자기 마음을 털어놓거나 하소연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낯선 사람 혹은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힘든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다. 잔혹한 개인 간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청년들은 타인들을 경쟁자 혹은 적으로 간주하며 서로를 포용하기보다는 깎아내리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인터뷰한 한 기사는 우울한 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그들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학생 취재원들은 모두 주변 사람에게 우울한 감정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같았다. 자신의 상황이 약점으로 작용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 취재원은 “다른 사람에게 우울함을 말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두운 면을 외부에 공개해서 약점 잡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나만 우울한가요?”… 정신건강 ‘빨간불’ 켜진 청년들, 『국민일보』, 2024년 11월 23일)
청년들은 개인주의 세대여서 세상을 개인(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매사에 자기 탓을 하는 편이다. 반면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적으며 사회개혁 의지도 박약하다. 여기에 더해 개인으로 고립되어 살아가기에 청년세대는 무력감이 심하다.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이지만 개인은 무력한 존재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룰 수 있고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투쟁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존 사회에 잘 적응하여 최대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뿐이다. 아무리 사회가 병들어 있더라도 개인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 한 개인은 거대한 사회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개인으로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불행이 병든 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자각을 갖기 힘들다. 설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나 혼자서 뭘 어쩌라고?”라고 읊조리며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청년들의 합리성에 주목해 기본직업 등 공동의 목표 제시해야
오늘날, 청년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우울하고 무력해서다. 청년들을 이렇게 만든 책임은 신자유주의의 파도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에 굴복한 기성세대에게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더 우울하고 무력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공포형 보수 – 극우세력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극우보수를 비합리적으로 지지한다 – 인 노인 세대와는 달리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청년들의 합리성(손익계산)이 공동체가 아니라 주로 개인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노인 세대와 같은 ‘묻지마 보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을 다시 청년답게 살게 해주고, 그들이 거리로 나오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기본소득과 기본직업 – 국가가 청년들의 직업이나 일자리를 책임지고 보장하는 제도 – 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동의 목표는 내 문제가 곧 모두의 문제라는 공동체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각자도생이 아닌 다른 길, 즉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극우 세력 제외한 젊은 남성들을 진짜 생각한다면, 훈계하는 듯한 태도부터 없애길.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말을 하는 기성세대 당신은 20대 때 얼마나 잘났다고.











